박종규 한국교수작가회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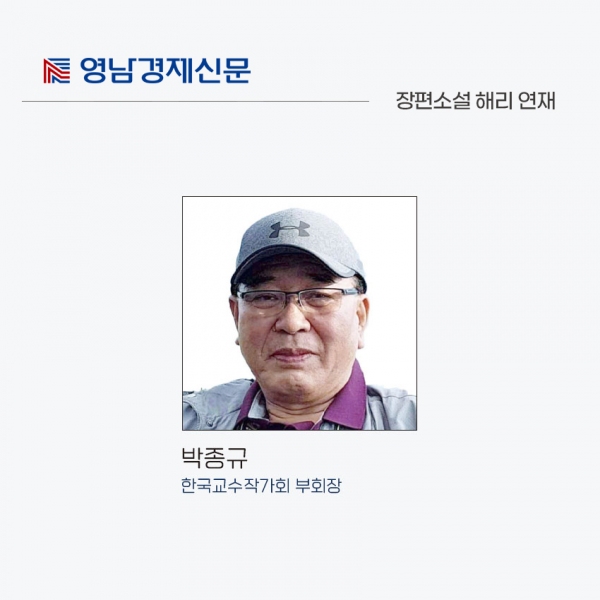
‘조태호?’
내 이름이 조태호인가? 메뉴를 눌러서 이것저것 실마리를 찾으려 하나 생소한 것뿐이다. 입력된 번호 중에서 하나를 누르자 신호가 간다. 어두운 웸홀에서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리는 기척이다. 그러나 전화기는 빛을 잃으며 어둠에 묻히고 있다.
- 여보세요, 여보세요?
좁은 공간을 울리는 애처로운 소리를 벽이 흡수해 버린다. 울컥 설움이 복받친다. 입을 떼려는데 입술만 떨린다.
- 나, 누구, 나 좀 구해 줘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휴대전화 덮개를 열어 보지만, 빛은 돌아오지 않는다. 힘겨운 시간이 이어진다. 차라리 이대로 자다가 죽는다면 고통이라도 없을 것 같다.
- 아저씨…….
가물가물 꺼져가는 음성이 들려온다. 그녀가 보내는 기척이다. 사방에서 새어든 빛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린 건물 잔해 사이로 어슴푸레 밀려난 공간을 가늠케 한다. 몸을 구부려 그곳에 비집고 들어가 숨죽여 귀를 기울인다. 역한 피비린내가 코밑에 달라붙는다. 귀를 벽에 대고 소리 나는 곳을 더듬는다. 시멘트 조각들을 헤치고 몸을 미적거려 다가간다. 언제부터였나, 내가 이 여자를 꼭 살려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기운을 더 내게 된 것은.
정신 차리라고 어디냐 물으니 바로 앞인 듯 기척이 느껴져 손을 뻗쳤으나 썰렁한 공간이다. 사람 몸통보다 조금 넓은 구멍이 까맣게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 여자는 이 구멍 너머에 있는 것 같다. 소리가 났던 쪽으로 허리를 구부려 접근한 다음 더듬는다. 여자의 몸이 만져지지만, 위에 두꺼운 각목이 배를 가로질러 누르고 있다. 각목 위에는 시멘트 덩이가 얹혀 있다. 각목을 두 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다. 바지직 소리와 함께 둔중한 각목이 조금씩 틈을 벌리는 것이 느껴진다.
- 아가씨, 자 움직여 봐요. 어서.
각목을 들어 올리자 합판 덩어리도 따라 움직인다. 힘을 모아 무게를 버텨낸다.
- 자, 어서 나와요. 여봐요 아가씨, 살아 있는 거야?
앞에 휑한 공간이 있다. 다른 무엇인가가 또 있다. 사람의 발이다. 공간으로 삐져나온 발을 잡아 흔드니 발목 부분까지만 덜렁 뽑혀 나온다.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도 못 낸다. 무섬증이 훅 끼친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밑으로부터 솟아올라 목을 움켜잡는다. 돌무더기 부대끼는 소리가 더욱 가까이 들린다.
- 아저씨….
숨이 찬 여자의 가녀린 외마디를 들으며 같이 밑으로 떨어진다. 허방 짚듯 깊이 떨어질수록 돌 부대끼는 소리 사이로 잔잔한 파도 소리가 밀려오는 것을 느낀다. 그건 어쩌면 수많은 사람의 웅성거림 일지도 모른다.
-
<시간을 거꾸로 읽어야>
목동에 있는 종합병원. 그는 살며시 눈을 뜬다.
“어머, 경아 아빠! 간호사님, 우린 애 아빠 정신이 들었어요!”
눈이 부시고 안개비가 내리는 것 같다. 그는 눈을 감는다. 그래도 안개비는 내리지만, 시야는 더 밝아지고 있다. 내려다보는 사람은 그의 아내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간호사가 다가온다.
“닷새만이시네요! 다행입니다.”
“여보. 나, 알아보겠어요?”
우는지 웃는지, 아내의 복받치는 목소리다. 그는 대답 대신 눈을 두어 번 깜빡인다. 몸을 약간 뒤척이니 팔과 다리가 침상에 붙어 침대의 무게가 느껴진다.
“안녕하세요? 여행 잘하셨어요?”
간호사가 손에 만년필 모양의 전등으로 그의 눈꺼풀을 들어 올려 불빛을 쏜다.
“마침 보호자께서 계셨네요.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올게요.”
이곳이 중환자실이라면 지정된 시간이 아니면 보호자가 같이 있을 수 없을 터이다. 간호사는 발길을 돌리고 그의 아내가 얼굴을 앞으로 들이민다.
“여보, 당신 이렇게 누워서 닷새째에요.”
“그래? 으음…….”
목에 무엇인가가 걸렸는지 발음이 꺾인다. 훤칠한 키의 의사가 간호사를 앞세워 침상으로 다가오더니 불빛을 눈에 쏘아 동공반사를 확인한다.
“선생님 성함이?”
“리…. 반입니다.”
리반? 자신의 이름이 생소하게 들린다. 리반은 속절없이 마치 남의 이름 같은 자신의 이름을 속으로 되뇐다.
“집은 어디세요?”
“목동.”
의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됐습니다. 어디 특별하게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프다면 온몸이 다 아픈 거고…, 잘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알아보시고요! 다행입니다. 이제 몇 가지만 체크하고 회복실로 옮겨 드리지요. 전신으로 쇼크가 왔으나 회복이 잘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당분간은 몸을 좀 사려서 움직이세요.”
의사는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슬쩍 웃더니 간호사와 함께 멀어져간다. 리반은 머리가 개운치 않고 몸도 무겁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모처럼 등산을 다녀와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도 몸이 이랬다. 창밖을 보니 녹음이 짙다. 그새 철이 바뀌었을까? 리반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아내를 물끄러미 올려다본다. 그녀는 착잡한 표정으로 남편의 이마에 내려온 머리를 쓸어 올리며 선웃음을 짓는다.
“정 교수님과 학생들이 몇 번 다녀갔어요. 의사가 뇌에는 특이 증상이 없어 의식이 꼭 돌아온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오래갈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내게…. 무슨 일이 있었지?”
의식을 잃고 있었다? 닷새나?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왜 낯선지. 리반은 정체성을 못 찾는데 아내는 그의 표정을 살피며 도리어 안도하고 있다. 장인어른 문제도 있고. 경아가 고3이니 아내도 힘들 텐데, 마음고생을 시킨 것 같다.
다음화에 계속
영남경제
yne484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