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한국교수작가회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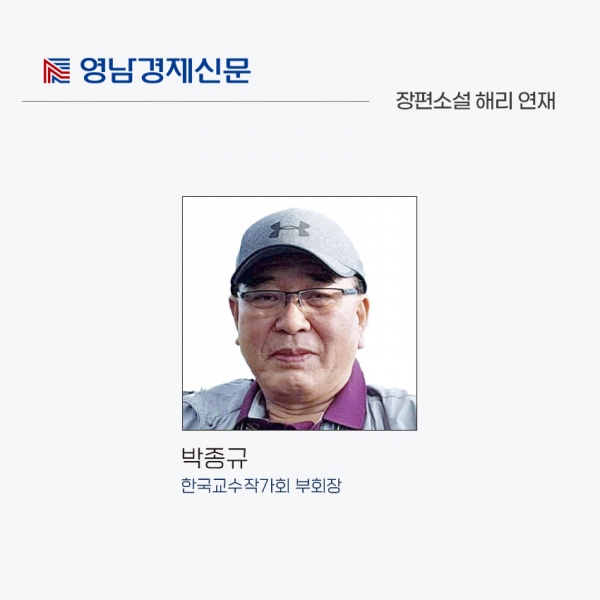
- 건물이 무너졌어요?
- 무서워요. 사람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저는 최슬아입니다. 아저씨도 그곳에 갇혔지요?
그녀는 이 빌딩 입주회사 직원이라 한다. 화장실에 있는데 별안간 천장과 벽이 갈라지더니, 천둥소리가 나면서 몸이 곤두박질쳤다고. 이 건물은 토레스 몰이라고 한다. 토레스 몰이 무너졌다면 수많은 사람이 깔렸을 테고 바깥은 지금 아수라장일 것이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일들이 눈에 삼삼한데 그런 큰 사고가 또 일어나다니.
- 무서워요! 너무 아파요. 건물 붕괴 몇 시간 전, 건물이 폭파될 거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다들 놀라서 쇼핑몰을 박차고 나갔지만 전 미처 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힘에 부친다. 건물 폭파 메시지를 미리 받았다고? 그렇다면 테러가 아닌가! 건물을 폭파하면서도 인명 피해는 최소화 한 테러?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아무튼,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 아프다는 말에 나를 돌아본다. 오금이 펴지지 않고 사지가 굳어버려 내 것이 아닌 듯하다. 몸이 화끈거리고 엉덩이가 쑤신다. 이제까지는 아픔보다는 배만 몹시 고팠다.
- 콘크리트 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쪽으로 접근이 안 돼요. 이곳도 사정은 비슷하니 정신을 잃지 말고 그냥 견뎌내요. 구조대가 우릴 꼭 구해줄 테니 정신 줄을 똑바로 잡고 있어요.
그 뒤 한동안 그쪽에서는 기척이 없다.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잠이 들었기를 바란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 아가씨…, 내 말 들어요? 잠이 오면 자 둬요. 깨어나면 구조가 되어 있을 거예요.
힘이 쭉 빠져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 흙먼지 때문인지 목이 깔깔하다. 힘들어하는 저쪽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우지지직 -
공간을 지탱하는 벽들이 흔들리며 시멘트 부스러기들을 쏟아낸다. 구조물이 위로부터 내리누르는 중량을 견디기가 힘겹다는 비명이리라. 멀리서 환청처럼 돌 부대끼는 소리가 들린다.
- 안 돼! 더는….
몸을 모퉁이 쪽으로 웅크리면서 눈을 질끈 감는다. 공간은 더 좁아졌으나 흙먼지가 내렸을 뿐, 다행히 더는 조여오지 않는다. 두려움에 익숙해지려는데 또 다른 절망에 맞닥뜨린다. 어둠이 덮쳤다! 깜깜한 속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벽도, 시멘트 바닥도, 삼각 꼴의 공간도 없다. 전등이 꺼졌다. 어질어질 현기증이 인다. 가늠할 수 없는 칠흑에 몸이 붕 뜬다. 하지만 어둠이 오니 두려움은 오히려 가시고 있다. 좁은 곳인지 넓은 곳인지, 눈을 감으니 공간감은 더욱더 팽창한다. 그리고 망막에 많은 것들이 떠다닌다. 바깥세상의 건물들, 구조대와 구급차, 취재진, 부상자들. 주검도 보인다. 흰 광목을 덮은 들것, 벽 저쪽의 여자가 들것에 실려 나가고, 그다음에는 내가 주검이 되어 따라 나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끝나는가.
- 아저씨, 물…….
환청인 듯 들리는 목소리. 나는 아직 주검이 아니다. 그녀가 나를 구해준 것 같다. 처음 대하는, 여자의 얼굴이 슬며시 나타나는데 표정은 모르겠다. 어둠이란 그지없이 묘하다. 전등이 밝았을 땐 몰랐던 처녀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오히려 보인다니. 그녀는 흙 얼룩이 졌으나 눈이 초롱초롱하다.
빛이 있어 사물을 볼 수 있으나 그 빛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철저히 감춰지고 있는 건 아닌지. 빛이야말로 시야를 한정시키는 또 하나의 벽이 아닐까?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는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말이다. 암흑의 시대에 빛의 등장은 절대자의 존재 자체였다. 그 뒤로 빛이 닿는 곳마다 사물이 존재를 드러내었다. 세상이 빛의 세상과 암흑의 세상으로 갈라졌다.
다음화에 계속
영남경제
yne484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