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구 전통장 오가향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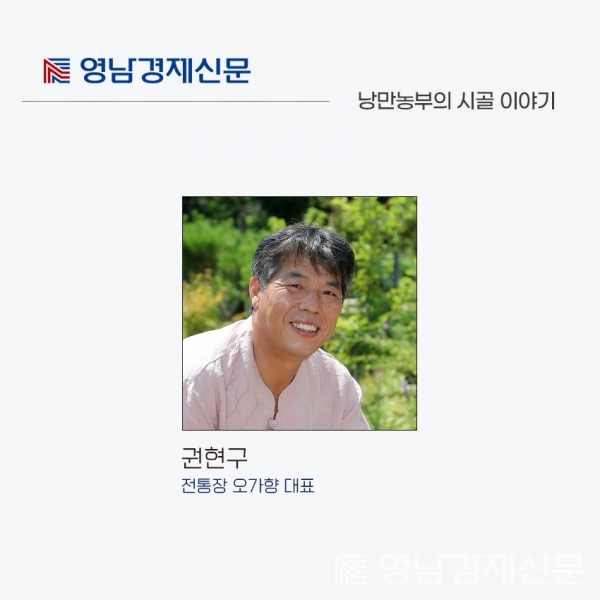
집에 하루종일 있기가 답답하여 가벼운 차림으로 무작정 나가보았다. 막상 밖에 나가도 갈데가 없는 요즘이다. 아내와 같이 앞산으로 산책을 갔다. 작년까지만 해도 가끔 오르곤 했는데 올해는 봄에 한 번 갔다가 오늘이 처음이다. 산은 봄은 봄 대로, 여름은 여름 대로, 또 가을은 가을 대로 저마다의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다. 겨울 산도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우리를 맞이한다.
겨울 산은 상당히 춥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나무들은 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고 모진 추위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다. 지나치게 자신을 가리지도 않고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다. 그러다보니 홈이 깊이 파인 나무의 상처도 쉽게 보인다. 오늘 나무에게도 이런저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새삼 알았다.
한참을 가다가 보니 허공에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퍼드득 깃을 털며 날아간다. 메마른 가지에는 듬성듬성 지어진 욕심 없는 새 둥지가 쓸쓸하게 남아 있다. 한때는 아기 새들이 아옹다옹 살았을 것이다. 새 둥지를 볼 때면 늘 신기하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눈에 눈물이 갑자기 핑 돈다.
슬퍼서가 아니라 빈 가지 사이로 드러난 투명한 하늘이 너무 푸르러서 그렇다. 조금만 더 오르면 맑고 푸른 하늘이 손에 잡힐 것만 같다. 그런데 잣나무 밑에는 멧돼지들이 땅을 일구어 놓아 순간적으로 머리가 섬뜩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추위 때문에 손끝마저 아려온다. 그렇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 갈 수도 없다. 오르지도 않고 돌아갈 거면 처음부터 오지 말아야 한다. 오늘은 예전에 산책하던 길을 한 바퀴 도는 것을 목표로 했기에 추위를 가르고 걸었다.

겨울 산에 오르면 그 차가움에 코끝이 시려올수록, 귀끝이 따갑게 아려올수록 가슴은 뜨거워짐을 느낀다. 아내와 같이 한참을 그렇게 올랐다. 오르막이 끝나니 거센 바람이 불어와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아,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 놀랍다. 그동안 앞산을 다닐 때마다 반겨 주던 멋있는 잣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는 것이다. 참 멋있게 자란 나무였다. 아마도 지난 여름 태풍에 못 견디고 넘어간 것 같다.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뿌리는 약한데 가지와 잎이 지나치게 무성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는 사회도 비슷할 것이다. 오죽하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을까.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잘 살고, 사람은 다리가 튼튼해야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동안 춥다고 꼼짝없이 방에 있었는데 이제는 운동도 좀 해야겠다.
산에서 우리들의 터전인 농장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왔다. 내려오다가 문득 뒤돌아보니 처음 왔을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그렇듯 산은 그곳에 조용히 있다. 다만 그곳에 드나드는 낭만농부만 변해 가는 것 같다. 겨울 산의 나무들이 잎을 모두 떨군 덕분인지 얼어 붙은 바닥에는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라난 겨울 풀들이 마음껏 파란 하늘과 햇살을 즐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