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한국교수작가회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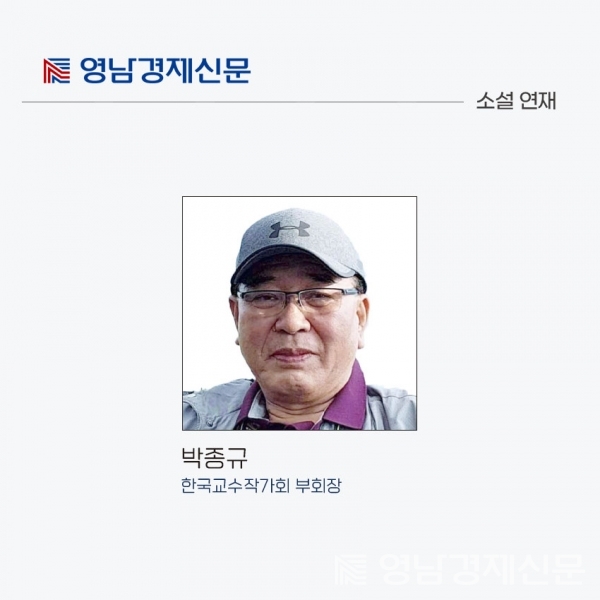
나는 안경이 내려오면 가운데를 밀어 올리는 습관이 있었다. 그걸 보며 유경이 한 말이었다. 유경은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그 말은 묘한 거부감이 스멀거리게 했다. 유경이 아직도 내 영역 밖에서 서성이는 존재라는, 유경에게는 다른 세계가 있어 나와의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말로 들렸다. 단순하게 건너온 말을 나는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동안 내밀하게만 흐른 감정선이 자극받았는지 아니면 알량한 복수심 같은 것이었는지 하여튼, 가운데든 귀퉁이든 뭔 상관이냐는 허세가 발동했던 것 같다. 결국 나는 유경이와의 사이를 가르는 말을 하고 말았다. 지금도 내가 그때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에 없고 유경이 말한 안경 귀퉁이만 기억에 남아 있다. 모처럼의 만남을 내 쪽으로 품어 들이지 못한 건 큰 실수였다. 내가 한 말은 유경을 내 곁에서 영영 떠나보내는, 나의 ‘인생 실수’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내게는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다. 안경 잡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나서야 우린 다시 마주 앉았다. 그 시절의 유경은 내게 데면데면한 편이었기에 다시 만나면 어떻게 나올지 조바심이 일었지만, 다행히 유경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예전 일들을 하나둘 떠올리면서 스스럼없이 옛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유경은 나와 함께 하지 못한 그 시절을 아쉬워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우리는 매주 거르지 않고 만나고 있다. 아이스케키 이야기로 옛일을 떠올렸을 때, 신문을 팔며 가판대에서 볶음 땅콩을 사 먹으면서 시장기 달랜 이야기를 꺼낼 때, 유경이 시장통에서 사준 찐빵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빵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유경은 눈시울을 붉혔다. 다음 만날 때에는 볶음 땅콩을 사가지고 나오겠다 했고, 예전에 나에게 냉담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고 했다. 유경은 예전과 달리 따뜻한 온기가 도는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
그날은 모처럼 바닷가에 차를 대고 차창 밖 물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쉬웠던 옛 기억을 하나둘 떠올렸다. 해변은 어느덧 어스름해졌고, 차창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에 유경의 뺨이 불그스레 익어갔다. 노을빛을 받은 유경의 얼굴에 신비감이 일었다. 꿈에 그리던,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던 인연. 그 사랑의 기운이 담긴 눈빛으로 유경이 입을 열었다. 거리를 두라는데, 우린 어쩌지? 그동안 우린 거리가 너무 멀었어. 우리가 거리를 어떻게 더 두겠어? 유경이 웃으며 내 손을 잡는다. 아님, 유경이만 뒷자리로 가서 앉든지. 싫어! 유경은 상체를 내게로 기댔다.
거리 두기와는 반대로 우린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거리가 좁혀들수록 어떤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해야 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경이 눈치를 챘는지 손을 토닥이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생각을 많이 해 보았는데. 우리 지금 잘 만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젠 코로나까지 우리를 방해하네! 방해가 아닌가?”
유경은 내 말을 들으며 무슨 생각에 골몰한 것 같았다. 이윽고 고개를 든 유경은 눈동자를 바삐 움직이더니 초조한 눈빛으로 입을 뗐다.
“하고 싶은 말이……. 그냥 우리 편하게 만나면 안 돼?”
생각을 짜낸 듯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천진스럽게 들렸다. 유경은 이날따라 더 예뻤다. 그냥 만나면 안 되느냐는 물음에 답을 못했다. 유경은 다른 말을 꺼내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 전과 다른 침묵이 길었다. 그때, 유경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서 물기가 비치는 것을 보았다. 유경이 내게 마음을 온전히 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빛의 조화였을까? 유경의 동그란 얼굴은 티끌 하나 없이 맑고 청순해 보였다. 조심스럽게 유경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내 손이 불경스러울 만큼 유경은 나이를 초월한 듯 순정해 보였다. 나는 유경의 얼굴을 가슴에 당겨 품고 고동 소리에 내 호흡을 맞추었다. 어릴 적 깊은 곳에 담아 둔 그리움을 전하고 싶었다. 혼잣말처럼 생각나는 말을 했다.
‘나…. 유경을 사랑했어, 이제라도 널 다시 사랑할 거야!’
끝내 못 한 두 마디였다. 유경은 입술을 살짝 떨면서 나를 바라보다가 눈을 지그시 감았다. 유경의 입술이 탐스럽게 보였다. 이제껏 상상도 못 했던 감정이 일었다. 나는 유경의 눈꺼풀을 감기며 회한을 더듬듯 입술을 더듬어 포갰다. 유경의 입술도 나를 받아들였다. 어느새 내 손이 유경의 허리께를 더듬어 올랐다. 그 순간, 유경은 화들짝 놀라면서 나를 힘껏 밀쳐냈다. 나는 그때 가슴이 왜 그리 철렁했는지 모른다. 유경이도 자기 행동에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자석이 같은 극끼리 서로를 밀어내듯, 그 어떤 반발력 때문에 뒤로 튕겨 나간 것 같았다. 우린 밀쳐낸 만큼의 거리를 두고 말을 더 잇지 못했다. 서로가 어떤 생각들을 추스르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화에 계속
영남경제
yne484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