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구 전통장 오가향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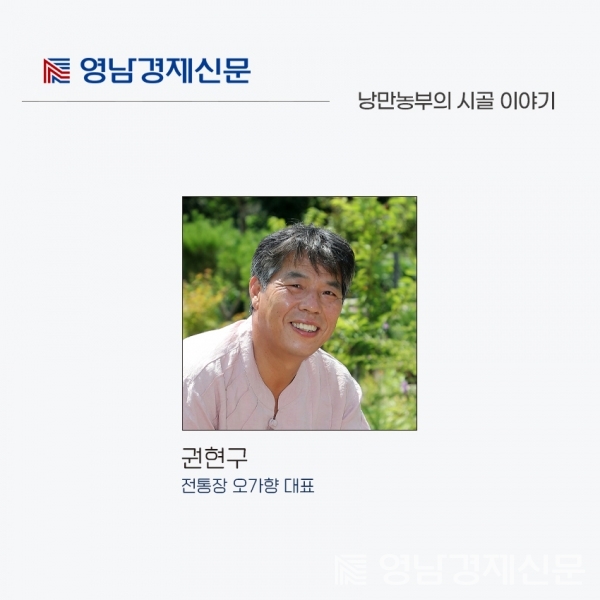
우연히 상사교회 앞에 있는 '노아시 나무'를 만났다. 그동안 수도 없이 지나 다녔는데 보이지 않았다. 무심코 지나쳤는지, 아니면 주변에 관심이 없어서였는지 이렇게 예쁜 열매가 달려있는 줄 몰랐다. 그런데 오늘 조롱조롱 달린 작은 감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고 보면 인연이란 이처럼 우연히 만나는 것이지 억지로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닌가 보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이웃 사람이 곶감을 하라고 감을 따가라고 한다. 올해는 감식초를 해볼까 싶어 갔다. 감을 따다가 우연히 교회 쪽을 바라보았는데 건너편 밭가에 주홍빛 작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고욤나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좀 큰 것 같았다. 감을 따고 난 뒤에 궁금하여 가까이 가서 보았다.
아내는 조금 말랑해진 것을 하나 따서 "분명 씨가 많을 거야."하며 눌러보았다. 예상하고는 달리 씨가 없었다. 그러면 고욤나무는 아니다. 이만한 크기의 감은 처음 본다. 나뭇가지마다 다닥다닥 수없이 붙어 있다. 서리를 맞은 잎은 다 떨어지고 열매가 어찌나 많이 달려 있는지 꽃보다 화려하고 환상적이다. 그야말로 자연의 신비가 아닐 수 없다. 색감 또한 잡티 하나 없는 주홍빛을 띄고 있다. 어떻게 이리도 열매가 많이 달릴 수 있는가 참 신기하였다. 맛을 보았더니 아직 떫다. 그러니 새들도 먹지 않은 것 같다.

밭에서 콩을 두드리고 있는 감나무 주인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 경주에서 단감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재를 넘어와서 이렇게 작은 감이 열렸단다. 설마 고개를 넘었다고 감의 성질이 바뀌었겠는가. 집에 와서 이름을 찾아보니 '노아시나무' 라고 한다. 다른 이름으로는 '애기감나무'로 불리기도 한단다. 노아시 열매는 삭막한 겨울에 설중홍시로 남아 동박새의 먹이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눈 내리는 한겨울에도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새로운 감나무도 보았고, 감도 땄으니 보람된 하루였다. 오늘 딴 감으로 일부는 감식초를 담그고, 일부는 곶감을 만들기 위해 처마 밑에 매달아 놓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말랭이도 하고, 홍시를 만들어 먹기 위해 남겨 두었다. 떫었던 감은 햇살과 바람, 그리고 시간을 품으며 단맛으로 무르익어 갈 것이다. 감의 여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닮은 듯하다. 싱싱하지만 아직은 떫은 젊은 날들이 있고, 세월이 지나서 달고 부드러워지는 홍시가 되는 것을 보면 말이다.
낭만농부도 젊은 시절에는 한 성깔하였는데 요즘은 다소 부드러워진 것을 보면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된다. 데크 난간에 올려진 주황색 감은 쌀쌀한 바람과 따뜻한 가을 햇살에 말랑말랑하고 맑은 선홍색으로 변해가고 있다.

